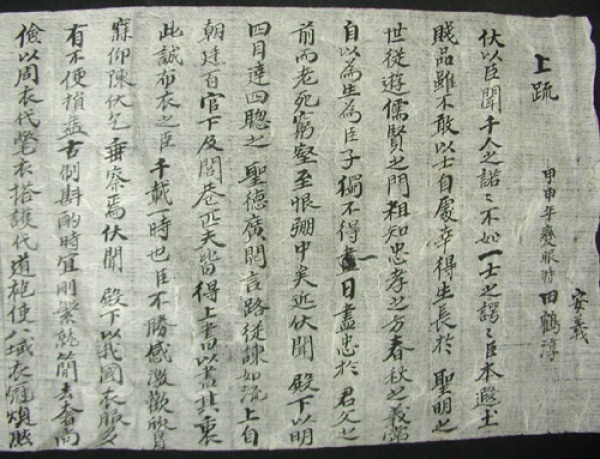■ 청풍공 이완희(淸風公 李完熙) [생졸년] 1906. 12. 08 ~ 1991. 12. 10 / 壽86歲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공(公)의 초명(初名)은 노석(魯碩), 자(字)는 자근(子根), 호(號)는 청풍(淸風), 성(性)은 경주이씨(慶州李氏)다. 고려(高麗) 말 문충공(文忠公) 익재 이제현(益齋 李齊賢)의 후손(後孫)으로 임진왜란(壬辰倭亂)때, 혁혁한 전공(戰功)을 세우고, 1624년(인조 2) 이괄((李 适)의 난(亂)을 평정한 형조판서(刑曹判書) 벽오 이시발(碧梧 李時發)의 12..